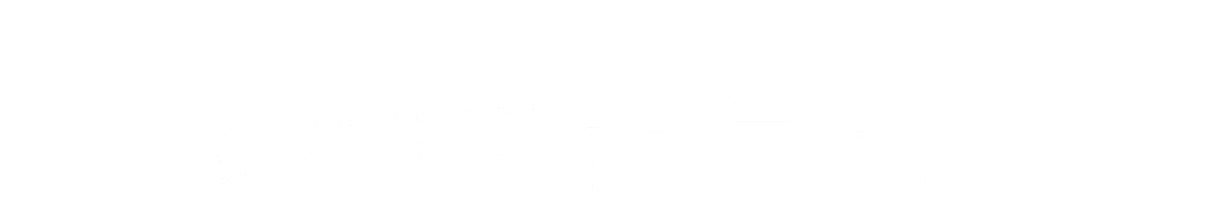퍼온 글

부산의 골목촌.
어딘지는 이야기하지 않겠다.
빼곡히 붙어져 있는 옆집들에 방음조차 제대로 될까 싶은 동네,
며칠 전에 하루 종일 비가 오던 날.
타일시공을 하는 나는
비를 최대한 덜 맞기 위해 아무 데나 가까워 보이는 식당으로 들어갔다.
비가 오면 그 물기로 인해서 코팅이 벗겨질 대로 벗겨져
미끌거리는 타일 바닥에, 허름한 식당.
같이 일하는 사람들끼리 밥을 시킨다.
제육볶음 4개 나오는데 상당히 오래 걸리더라.
배가 너무 고픈 나는 이모님에게 한번 여쭈어 보았다
"이모님 나오는데 오래 걸리나요?"
"있어봐요, 12시부터 오픈인데 빨리 온 사람이 문제지"
불친절하다, 기분 나쁘다.
기분 나쁜 걸 참으며 밥을 먹는데, 음식맛은 또 괜찮더라.
다 먹고 나서 계산하려고 정확한 금액을 현금으로 꺼냈는데, 화를 낸다.
"콜라값 2천 원은 왜 빼먹니?"
"아, 맞네. 콜라값 줄게요."
"계산은 정확해야지, 총각아."
기분 나쁘다. 다신 안 온다.
비가 조금 사그라들면 가자고
앞에 흡연용 재떨이가 있길래,
거기서 사람들이랑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우리가 먹었던 가게로 애가 한 명이 들어간다.
속으로 말리고 싶었다.
저 아줌마 무섭다고..
담배 피우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도,
내 눈은 계속 그 식당에 꽂혀있었는데
그 아이는 무엇을 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이의 몸통만큼 채워진 비닐봉지를 가지고 식당을 나가는 아이에게,
그 아줌마는 머리를 쓰다듬어주면서
"쉬는 거부터 무라, 덥혀서 묵고."
반갑게 인사하고는 다시 식당으로 들어가더라.
그 와중 같이 점심 먹으러 나왔던 형님은 내게 물어봤다.
"근호야 내일은 어디서 물래?"
"여기요, 형님."
난 저 가게가 궁금해졌다.
다음날 똑같은 인원, 똑같은 메뉴.
하지만 달라진 아줌마에 대한 시선
다시 계산을 할 때쯤에 물어본다.
물론 이번에는 현찰을 넉넉히 챙겨서
"어제 저희 밥 먹고 들어가던 애, 여기 뭐 사러 왔던 거예요?
맛있는 냄새 나서 나도 사가게요."
"공깃밥 사러 온 애 말하는 거예요?"
"공깃밥 아니던데? 비닐봉지 채로 들고 간 애 있잖아요, "
"그 애 맞아요."
"그럼 거기 있는 봉지는 뭐예요?"
"근처 사는 앤 데, 부모님 일한다고 바빠서 밥 못해놓고 갈 때는 여기서 공깃밥 사서 가요.
그리고 그냥 햄이랑 국 하나 덥혀서 같이 주는 거지."
"그 돈은 그럼 그 집 부모님한테 받아요?"
"먼 돈을 받아, 그냥 먹으라고 주는 거지."
"좋은 일 하시네요 이모님."
어릴 때 골목 주택에서 살았던 내가 그 분위기를 아는데
하도 빽빽이 붙어있다 보니깐 모르고 싶어도 그 집의 분위기를 안다.
그리고 남몰래 위로하기도 하고.
그리고 일을 마치고 저녁에 줄자를 하나 가지고 간다.
그 식당이 아직 영업을 하기를 바라면서.
실비집이다 보니 아직 할 것이다는 확신이 있었다.
역시나, 아직 한다.
이모님한테 가서 여쭙는다.
"이모님 여기 바닥 많이 미끌거리던데 비 오면 사람들 안 미끄러워해요?"
"타일이 오래돼 가꼬 미끌거립니다, 근데 왜요?"
"제가 이거 안 미끄러운 재질로 타일 붙여드릴까?"
"머 한다고요?"
의심하는 눈초리, 낯선 사람이 하는 이야기에 대한 불신.
당연히 이해가 간다.
"애 밥 못 묵는다고 챙기주는 이모님 마음이 예뻐서요,
쉬는 날 바깥에만 이라도 해줄게요. 이거 사람 넘어진다."
"해주면 좋지요, 근데 돈 들어요?"
"안 들어요."
월요일 영업을 쉰다고 해서 그날 가서 시공을 해주고 왔다.
쉬는 날인데 뭔 일인가 싶어서 와봤는 이모님은
이제서야 그냥 완전히 믿으시고는,
고생했는데 배고프다고, 라면이라도 하나 끓여 먹고 가라면서
라면을 하나 해주셨다.
또 한 번 되물으신다.
"뭐할라고 이런 거 해줍니까? 돈아깝구로."
사실 난 꾸준히 자비로 이런 공사들을 아직도 하고 있다.
왜 이렇게 크면서 더 오지랖만 넓어졌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어릴 때 나는 길거리에서 사는 게 힘들어서,
펑펑 울면서 주저앉아 있을 때가 한번 있었다.
그때 한 아저씨가 차에서 내렸다.
차에서 내려서는
"니 왜 울고 처자빠져있냐, 니 집 어디냐, 타라."
그렇게 차를 얻어 타고 집으로 데려다주더라.
차로 데려다주면서 그 아저씨가 이유를 묻길래
"돈이 없어서, 서러워서 울어요."
라고 대답했다.
우는걸 끝까지 다 듣고 있다가 집에 도착하니깐
아저씨는 나한테 5만 원을 쥐어주고 말했다.
"힘들어도 이겨내라, 남자새끼가 멀 질질 짜고 있냐?" 라고.
그랬던 그분이 멋있어 보여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였을까?
나이가 들수록 세상은 각박하다는 걸 알아채고 있는 내가.
'이 세상에는 사람 냄새라는 게 아직도 있다.'
는 한줄기 희망이라도 가지고 싶어서일까?
아직도 그에 대한 답을 나는 모르기에,
그냥 대충 이야기를 하고 때운다.
"좋은 일 하면 좋은 게 돌아와야죠"
이센스가 말했다,
"존나 고생하고 열심히 하는 애들,
'고생했다고, 너 존나 멋있다'
라고 이야기 해주는 게 힙합이라고"
그렇다면 내 인생은 힙합이다.
힙합
힙합은, 무분별한 자유를 추구하기에 눈에 담기도 싫은 방종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런 따뜻한 자유라면 환영이다.
이런게 현대문학이지.
'감성의 영역 > 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60603] 연휴 (1) | 2025.06.03 |
|---|---|
| [20250525] 힘든 과정의 뒤에는 아름다운 결실이 따르길 (4) | 2025.05.25 |
| [20250517] 해는 지고나서야 비로소 똑바로 볼 수 있다 (1) | 2025.05.18 |
| [20250504] 연휴가 연휴다워야지 (6) | 2025.05.04 |
| [20250426] 그렇게 믿기로 했습니다. (4) | 2025.04.26 |